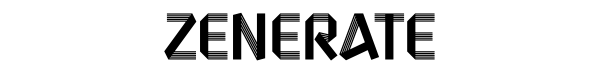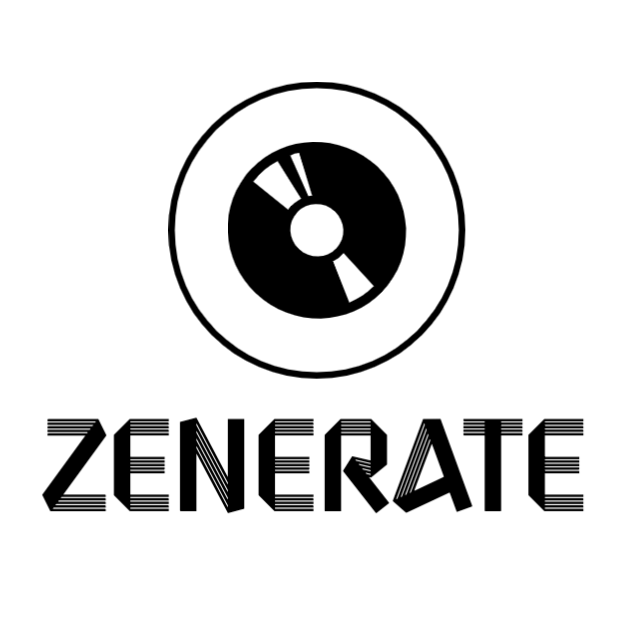[2023년 결산] 올해의 한국 음악 50 조망
음악에 진 빚을 갚기 위해 2024년도 음악을 듣는다.
얌전하게 말하자면 '이런 빌어먹을 세상' (세븐틴, 'F*ck My Life')이었다. 거칠게 말하자면 저드(jerd)의 노래처럼 'X됐어'를 달고 살았던 한 해였다. 2023년은 여러 모로 나쁜 소식만 크게 들렸던 해였다. 팬데믹 종식을 기념하던 안이한 기쁨은 기후 위기와 전쟁으로 금세 사그라들었다. 이태원에서의 비극적인 참사 이후 시스템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낀 사회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고 편안하게 마음을 내줄 수 없는 견리망의(見利忘義)의 지옥으로 변해갔다. 음울한 진공의 팬데믹 시기를 투영하는 작품이 더욱 그늘진 오늘에 등장하리라고는 창작자들도, 음악 팬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 시끄럽고 더 불온하고 더 강력한 소리가 전면에 등장했다. 한국은 이 세계적인 조용한 폭발의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포스트락과 슈게이징 장르 작품이 많이 등장한 국가였다. 2010년대의 드림팝부터 작금의 슈게이징까지 세계적 음악 흐름에 빠르게 발맞춰온 결실이다. 레이트유어뮤직과 영미권 음악 매체들의 주목과 함께 떠오른 '행동하는 찐따' 파란노을의 'After The Magic'은 사회가 밀어내고 규정짓는 패배자들의 커뮤니티가 2000년대 낭만의 시대로 여겨지는 인디의 표상이나 해로운 '남초커뮤'에서 머무르지 않고 연대를 통해 더 나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의 작품이었다. 감정의 밑바닥으로 스스로 몸을 내던진 브로큰티스의 '추락은 천천히'가 슈게이징 밴드에 기대할 수 있는 모범을 들려줬다면, 네이처트로니카를 표방한 장명선의 '천사의 몫'과 앨범의 프로듀서 피아노 슈게이저의 데뷔작 'Sisyphus Happy'는 전자음악으로 기억을 더듬어 초월을 꿈꾸는 창작가의 앨범이었다. 시끄러운 음악은 아니었지만 모든 규칙을 거부하려는 듯 자유분방한 작품도 있었다. 유라의 '꽤 많은 수의 촉수 돌기'다.
록스타도 출현했다. 2022년의 'No Pain'과 함께 급속히 세를 키운 실리카겔은 사이키델릭과 프로그레시브의 결합, 연주와 오케스트라 중심의 편곡에서 약간의 대중적 멜로디 터치를 더해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한국 밴드 신의 가장 주목할 이름이 되었다. 자국에서만 잘 모르는 웨이브 투 어스는 올해 2CD 정규 앨범 '0.1 flows and all'로 아시아권 대표 밴드의 지위를 굳혔다. 안다영과 구름의 프로듀싱에 힘입어 쓸쓸한 록스타로의 전환을 선언한 정우의 '클라우드 쿠쿠 랜드'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꿈결이 아니고서야 개선할 수 없는 아수라의 세계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세상을 등지고 마는 '낡은 괴담'은 2023년을 정의하는 중요한 노래다. 홍대 앞 슈퍼그룹으로 명성을 떨치던 봉제인간의 '12가지 말들'은 프론트맨 지윤해의 파라솔 시기를 연상케 하면서도 임현제와 전일준의 광기 어린 연주로 말초적 쾌감을 자극하는 매쓰 록 앨범이었다. 그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장기하의 '해/할건지말건지' 역시 훌륭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마지막 앨범 'mono'에서 의기소침해 보였던 그는 작년 해학적인 '가만있어도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와 함께 유유자적 의욕을 찾더니 행동을 촉구하는 노래로 왕성함을 되찾았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들려준 코토바의 'humanoid operational', 끓어오르는 에너지로 가득한 다브다의 'Yonder'도 좋은 앨범이다.
혼란의 시대를 장식하는 무아지경의 전자 음악 시장에서는 페기 구가 'It Makes You Forget (Itgehane)'의 정신적 후속작 '(It Goes Like) Nanana'로 세계를 휩쓰는 사이, 한국에서는 키라라가 크라프트베르크와 코넬리우스의 선례를 본받아 합창을 유도하는 '숫자'를 발표했다. 개인을 함부로 단정하는 사회 속 '예쁘고 강한' 음악을 선보였던 그는 향후 즐거운 댄스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변화무쌍한 시선이 빛났던 클로짓 이(Closet Yi)의 'POH (Point of Hue)', 브레이크비트 중심의 스트릿 컬처 전자 음악으로 귀를 즐겁게 한 보잭(bojvck)의 'I Think You Need Some Break'은 올해의 작품이다. 오랜 시간 전광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프로듀서 마운트 XLR(Mount XLR)의 2023년 작업은 한 해 내내 역동적이었다. 그가 참여한 크러쉬의 'Got Me Got You' 역시 필청곡이다.
가장 뜨겁고 무모한 힙합 작품이라면 스카이민혁의 '해방'이 으뜸이다. 경력으로 성장을 거듭 증명하는 그가 악에 받쳐 내뱉는 증명의 욕구는 조그마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기에 충분했다. 한 해 먼저 시대를 앞서갔던 짱유와 제이플로우의 힙노시스 테라피도 한층 더 눈치 보지 않는 빅 비트와 테크노를 선보이며 코리안 레이브를 꿈꿨다. 그 균형을 가장 세련된 형태로 유지한 작품이 키드 밀리의 'Beige'다. 서늘한 메시지로는 훌륭한 데뷔 앨범 '밭'을 발표했던 오도마의 신랄한 현대 사회 진단서 '선전기술 X'가 으뜸이었다. 다시금 고삐를 챈 이센스의 '저금통'은 랩 게임의 말초적 쾌감을 전했다. '저금통'과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빈지노의 'NOWITKI'가 열정적인 20대를 보낸 남성의 여유로운 30대로의 성장담을 펼치며 피로를 씻어준 것과는 반대였다.
강한 음악만큼 앞만 보고 달렸던 가수들의 회고와 위로도 많이 들렸던 2023년이었다. 특히 알앤비 진영의 싱어송라이터들이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미처 보듬지 못했던 자아를 치유하거나, 대중적 표상과 개인의 지향을 절충하며 확장을 꿈꿨다. 휘몰아치는 우울을 내밀하게 고백한 저드의 'BOMM'과 다채로운 프로덕션으로 균형을 맞춘 후디의 '항해', 독특한 시선이 빛났던 구원찬의 'Object'와 오션프롬더블루의 자전적인 첫 정규작 'oceanfromtheblue'가 그런 새로움으로 빛났다. 만능 음악 줄기세포를 보유한 창작가 수민이 내놓은 '시치미'는 타협과 발전의 유연한 공존지대를 구축했다. 소울 밴드이자 블랙 뮤직 커뮤니티를 표방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운 소울 딜리버리의 'Peninsula Park'도 올해 용기를 준 작품이었다.
윤지영의 '나의 정원에서'만큼 서툰 이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극적인 광경을 만든 곡은 많지 않았다. 재능 있는 창작가 빅 나티는 한국 가요의 통속적인 문법을 비틀어 Z세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오직 그만이 가능한 코드워크와 화려한 편곡으로 연약한 영혼을 안아주었던 이진아의 '도시의 속마음', 제이팝의 대유행 가운데 유행하는 밴드 사운드를 가장 모나지 않게 이식한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 바스러질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비틀거리는 20대 초 감정을 투명하게 부른 한로로의 작품이 인상 깊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한층 더 성장하여 돌아온 영케이의 사랑과 긍정 찬가 'Letters with notes' 역시 멋진 싱어송라이터의 등장을 알렸다.
이런 류의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글을 읽다 보면 흔한 결론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음악이 유명해질리는 없다거나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거나 하는 류의 자조와 푸념이다. 맞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2023년보다 더 최악의 2024년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X됐어'가 절로 나오는 세계, 그리고 그런 비관적인 감정에 짓눌리는 대중과 소통하는 이들이 예술가들이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한 해였지만 정밀아의 '리버사이드'가 없었다면 숱한 이들의 죽음 앞에 목놓아 울어보지도 못했을 테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허물어지는 자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착잡함과 위기의식을 투영하는데 이민휘의 '미래의 고향'이 나오지 않았다면 허전했을 테다. 가난한 이들이 황푸하의 '두 얼굴'을 들으며 불편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며 이형주의 '우리는 서로를 간직하려고'와 함께 투쟁하는 광경조차 없다면 이 사회는 더욱 끔찍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음악에 진 빚을 갚기 위해 2024년도 음악을 듣는다.